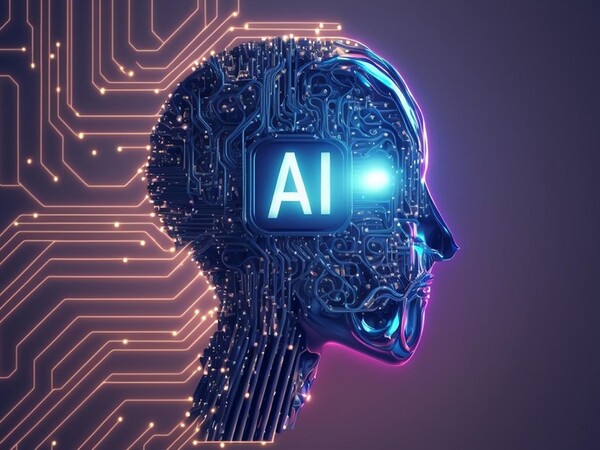
야담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때가 있었다. 어려서였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다. 난 어렸고 내 위의 언니가 좋아하여 읽다가 보니 나는 그 우수리로 읽었다. 50년대다 '야담과 실화'란 월간지가 있었다. 그걸 내 언니가 늘 구독하였기에 나는 이른 나이에 맛 들인 셈이다. 맛 들였다기 보다 그냥 심심한 시간을 때웠다. 근데 그게 은근히 내 안에서 역사의 얼개를 만들고 있음을 알 때는 좀 머쓱하다.
며칠 전 과학자들의 대담에서 진화론은 진화라기 보다 변화라고 함이 맞다는 말을 들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무조건 앞으로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게 인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그 대화 청취 다음에 생각났다. 어느 기능은 퇴화란 걸 전혀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화의 그늘에 퇴화가 있다는 건 그냥 묵살해버리면 되는 걸로 알았던 듯하다.
예전의 전투에서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휘둘렀던 칼은 현대인이라면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들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달리기나 도보는 어떤가. 완력으로 해내야 할 일들은 동력이 없을 시대의 사람들보다 현대인이 후질 건 뻔하다. 아마도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의 작은 일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려니 한다. 처음부터 진화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였을까? 그 학술적 과학적 전문용어가 인간의 지능과 사회 발달에만 초점을 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인간이 만든 많은 발전들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편리하여 그 방향으로의 앞으로 나아감이 바로 발달이었다는 생각이라면 진화는 맞겠다.
미국에서 작은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아미쉬들은 종교적인 믿음이 바탕이라고 하나 삶의 모양은 자연주의 같아 보인다. 인간이 만든 동력을 거부하며 살고 소비생활이 워낙 소박 검소하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아름다운 사회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사회를 보면, 물론 나 같은 이방인이 직접 잘 들여다 볼 수는 없고 보도나 간접물 뿐이긴 하지만, 이미 문명에 오염된 눈으로 익숙한 생활로 판단하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걸 보면 변화라기 보다 진화가 더 맞지 않나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지금은 진화가 하나의 과학적인 전문용어로 자라잡았지만 진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안다. 이제 인간복제가 가능하여지면 지금까지 전혀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인간의 자질과 능력 수명 등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미래도 보인다. 어떤 무서운 사회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판단 내려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진화를 변화란 단어로 바꾸어보니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 앞으로만 가면 뒤로 물러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변화라는 말에는 쉽게 옆으로도 뒤로도 360도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것만 고를 수도 있겠거니 해서다.
인간의 신창조론이나 진화론의 첨예한 대척이 변화란 말로는 좀 부드럽게 받아들여진다. 모든 생명들이란 주어진 그 순간부터 독자적인 생명 작업을 해왔으니까 변화하였고 변화는 인간을 중심에 두면 지금까지 진화 쪽이 더 무겁다. 여태 진화 쪽으로 변화한 인간들이 파괴자로 변화하려 할까? 그것도 순간 변화는 아닐 테니....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파괴의 길로 들어섰더라도 물러서기도 하고 파행하기도 하겠지만 문득 멈추는 순간이 오겠지 하는 공상적이면서도 안일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용어 하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