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를 집에서 끝까지 모신 어느 아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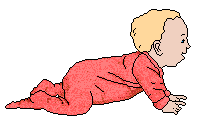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많다. 여러 경우의 사람이 있겠지만, 중증 치매에 걸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노령의 어머니를 살던 집에서 끝까지 모신 아들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을 50 초반에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던 중에 함께 살고 있던 여든 살의 노모가 치매를 앓게 됐다. 집에는 부인과 여고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다. 부인은 전업주부였으나 치매 노인을 직접 수발한다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긴 병치레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웅변한다. 아들은 몰라도 며느리는 인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직접 말을 듣지 않아도 치매 환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음을 대체로 이해한다. 그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졌다. 아침이면 남편이 사업을 위해 나가게 되면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니었다. 집을 몰래 나가 길을 잃어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같이 지내는 가족의 마음고생은 이루 헤아리기 쉽지 않았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권했다. 남편은 그럴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 또 시간이 지났다. 증세는 더 심해졌다. 나이도 90세에 접어들었고 대변을 방 벽면에 짓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다시 의논했다. 남편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모실 거라 했다. 그 어머니는 아주 젊은 시절에 혼자 몸이 되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남매를 지극 정성으로 키웠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다. 첫째 딸은 서독에 간호사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살고 있어서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다. 며느리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둘은 갈라섰다.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저녁이면 아들 본인이 수발을 들었다. 아내와 헤어진 지 6년이 지나고 노인의 나이가 96세 어느 여름날 어르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상주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했듯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서 모셔도 아쉬움만 남고 후회스러운 일만 생각난다는 상주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 부모가 백수를 하여도 자식은 늘 아쉬운가 보다.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까지 운명할 때까지 어머니 곁을 지킨 그 아들의 행동은 대견하다.
요즘은 치매나 중풍 증세가 있으면 십중팔구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모시기 일쑤다. 주변에서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당사자도 그러려니 생각하며 순응한다. 필자 부부도 그럴 계획이다. 두 달 전쯤에 전 직장의 상사였던 82세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요양원으로 자진해 들어갔다. 최근까지 시니어 테니스 선수로 전국 순회를 하던 건강한 분이었다. 갑자기 왼쪽 어깨와 팔다리에 중풍 증상이 왔고 치료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은 서울에서 먼 곳의 요양시설로 갔다. 지인들이 병문안을 가겠다는 연락을 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자기의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컸을지 모른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현재 살던 곳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기를 바란다.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살던 정든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죽음을 맞게 한 예의 그 아들은 분명 효자다. 대단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